4. 중동 지역 제민족들의 태양신 부활절 행사와 그 풍습들
a. 개요
영국이 낳은 그리스 고전학과 종교 인류학으로 명성을 떨친 석학 프레이저(James George Frazer, A.D. 1854-1941) 경은 그의 대작 황금 가지(The Golden Bough)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319.4)
“동부 지중해와 접경한 여러 지방보다 이 의식이 광범위하고 장엄하게 거행된 곳은 없다. 이집트와 서부 아시아의 여러 민족은 오시리스(Osiris), 탐무즈(Tammuz), 아도니스(Adonis), 그리고 앗티스(Attis)의 이름으로 매년 죽어 다시 소생하는 신으로서 인격화한 생명, 특히 식물의 생명을 죽이고 부활시키는 의식을 거행하였다. 지방마다 그 의식의 명칭과 세부적인 사항이 달랐다. 그러나 그 본질은 동일하였다. 이 동양의 신, 그 이름은 여러 가지이나 본질은 동일한 이 신의 상상된 죽음과 부활에 관한 것이다.... 아도니스의 숭배는 바빌로니아와 시리아의 셈족들에 의해서 행해졌으며 그리스인은 이미 B.C. 7세기 때 그들로부터 그것을 수용하였다. 이 신의 진짜 이름은 탐무즈였다. 아도니스란 칭호는 셈어의 아돈, 즉 ‘주님’이다. 이 아돈이라는 말은 숭배자들이 그를 부를 때 사용하는 존칭이다. 그런데 그리스인은 이것을 오해하여 이 존칭을 고유의 이름으로 바꿔버렸다. 바벨론의 종교 문학에서는 이 탐무즈는 자연의 생식력의 구현인 대모신 이쉬타르(Ishtar)의 젊은 배우자나 혹은 애인으로 나타난다.... .”19) (31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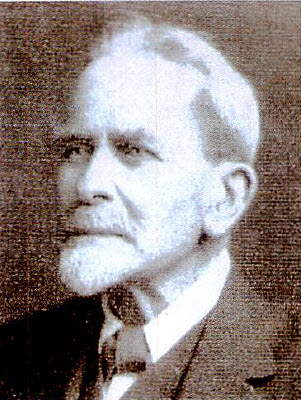
프레이저 경
또한 대한기독교서회에서 발행한 신약성서신학에서도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320.2)
“이것은 ... 자연히 말라죽으며, 그러한 가운데 새 생명이 움트는 신비를 상징한 것이다. 시리아의 아도니스(Adonis), 프리기아의 앗티스(Attis), 애굽의 오시리스(Osiris), 바벨론의 탐무즈(Tammuz)는 다 이같은 신들이었다. 그 모든 신들은 죽고 다시 사는 신비로운 농신(農神)을 대표하였다.”20)
이제 우리는 여기서 초기 그리스도교에 그처럼 강력하게 영향을 끼쳤던 이 “태양신 부활 신화”와 관련된 의식들을 살펴보면, 그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부활 축제 의식”으로 변모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을 인식하게 될 것이며, 동시에 마리아를 여신으로 모시게 된 사유도 쉽게 이해하게 될 것이다. (32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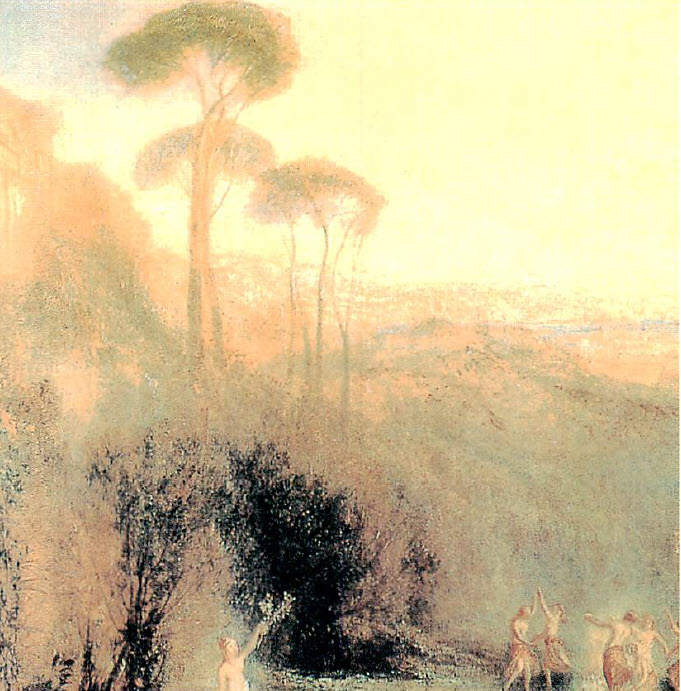
황금가지

오른손에 의식때 쓰는 악기 시스트롬(Sistrum)을 들고 있는 이집트의 여신 이시스가 로마화 된 로마의 이시스상
b. 바빌로니아의 태양신 탐무즈와 그의 배우신 이쉬타르와 얽힌 부활신화
앗시리아—바빌로니아 신화에 의하면, 태양신 탐무주는 “봄에 태어나 가을에 사멸하는 곡물의 정(精), 수확의 신, 수목의 신, 죽음과 부활의 신이다.”21) 바빌로니아 역으로 4월을 “탐무주의 달”22)이라고 부른다. (323.1)
앗시리아-바빌로니아의 만신전에서, 사랑과 미의 여신으로, 다산과 풍요, 정열과 욕정의 신으로 최고의 각광을 받고 있는 신은 이쉬타르(Ishtar)인데, 그녀는 또한 전쟁도 관장하였다. 이 여신 이쉬타르는 젊음이 물씬 넘치는 그녀의 연인 탐무주를 심히 사랑했다. 고대 바빌로니아의 신화가 전하는 전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323.2)
“이쉬타르의 사랑은 치명적이었다. 이 여신은 탐무주(Tammuzu)를 사랑했는데, 길가메쉬(Gilgamash)의 말에 의하면 그 사랑은 탐무주의 죽음을 초래했다. 이쉬타르는 그것을 무척 슬퍼하고 애인에게 비탄의 눈물을 뿌렸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후에 아프로디테는 아도니스의 죽음을 애탄하게 되었다. 탐무주를 찾기 위해, 그리고 끔찍한 저승으로부터 살려내기 위해, 그녀는 지옥에 내려가서 <돌아오지 않는 땅에 일단 들어간 자는 나올 수 없는 집>으로 가기로 결심하였다. 그녀는 지옥의 문을 열게 하고 하나씩 하나씩 몸에 지닌 장신구를 빼앗기고 7개의 성곽을 기연히 뚫고 들어갔다. 그녀의 머리 위의 큰 관, 귀걸이, 목걸이, 가슴의 장식, 탄생의 보석을 박은 허리 띠, 손목과 발목의 장식, 끝으로 그녀가 입은 정결의 의상 모든 것을 빼앗겼다. 이쉬타르는 지옥의 여왕 에레슈키갈[화성(火星) 네르갈(Nergal)의 배우 여신] 앞에 다다라서 그녀에게 덤벼들었다. 그러나 에레슈키갈은 자기의 심부름꾼인 남타루(Nam-tarou)에게 도움을 청하여 그로 하여금 이쉬타르를 궁정에 유폐시켜, 예순 가지의 병에 걸리게 했다. 이렇게 해서 이쉬타르는 포로가 되었는데, 그 사실이 지상에서는 고뇌요, 하늘에서도 무한한 슬픔이 되었다.”23)

이쉬타르. 파리 루브르 미술관 소장
“지상에서 사랑의 신이 어디론가 그 모습을 숨겨버려서 아기도 태어나지 않고, 동물도 번식하지 않으며, 식물도 번성하지 않아 큰 소동이 벌어졌다. 이것을 우려한 여러 신들이 회의를 열고”24) 사랑의 여신 이쉬타르를 구하기로 합의했다. (324.1)
그리하여 이쉬타르의 오라비 “샤마쉬(Shamash)와 그의 아비 신(Sin)은 에아(Ea, 땅과 물의 신)에게 가서 애원했다. 에아는 이쉬타르를 구하기 위하여 아수슈나미르(Asoushounamir)를 만들어 그를 여자로 변장시켜, 마술의 주문을 가르쳐서, 돌아오지 않는 땅으로 보냈다. 그 주문은 에레슈키갈의 의지를 구속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지옥의 여왕의 저항도 아랑곳없이, 그녀는 <위대한 마술>에 의해 아수슈나미르에게 주박(呪縛)당해 버렸다. 에아의 주문의 힘은 더 강했다. 에레슈키갈은 이쉬타르를 석방해 주지 않을 수 없었다. 이쉬타르는 생명의 물이 끼얹어져 남타루에 안내되어 도중에 앞서 잃어버린 장신구를 하나 하나 되찾으면서 일곱 개의 문을 넘어섰다. 그녀의 출발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 탐무주는 축전의 의상을 입고, 피리를 불었다. 왜냐하면 지옥의 여신 벨리리(Bêlili, 탐무즈의 여동생)가 말하고 있듯이 탐무즈가 나를 위해 흑옥탄(黑玉炭)의 고리를 낀 청금석의 피리를 불어줄 때, 그와 함께 곡하는 남녀가 울어줄 때, 죽은 자들은 다시 일어서서 은은한 향기를 맡는다.”25)는 것이다. (325.1)
땅과 물을 관장하는 신(神) 에아(Ea)의 도움으로 “생명의 물”로 표상된 봄비가 대지에 조용하게 내릴 때, 기나 긴 악몽 같은 암흑의 겨울(흑암의 여신의 세력)을 벗어나게 되어 다시 지상으로 돌아오게 된 이쉬타르(Ishtar)는 그녀의 연인 탐무주(Tammuzu)와 재회의 기쁨, 결혼의 환희를 함께 나누는 때가 바로 새싹 트는 따사로운 봄인 것이다. 이리하여 이 지상에는 다시 사랑이 속삭이게 되고, 생명력이 소생하여 약동하게 되었다. (325.2)
최태응은 이 신화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끝맺었다: (325.3)
“이 이야기는 이집트에선 오시리스와 이시스의 이야기로, 그리고 그리스에선 비너스와 아도니스의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다. 어느 것이나 대지의 생산력을 상징한 신석기 시대 말기의 대모신(大母神) 숭배에 그 기원을 가진 내용이다.” (326.1)